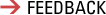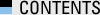| |||||||||||
이 책은 책에 관한 책이며, 수필이다. 친한 친구의 서평을 보고 읽기를 망설여 1년 정도 구매 예정 리스트에 있던 책이었는데 막상 읽어보니 꽤 괜찮은 책이었다. 몇 가지 느낀 점을 두서없이 적어본다
이 책을 다 읽고 생각하기를 나는 수필(에세이) 종류를 꽤 좋아하는 것 같다. 대학교 들어가기전에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성인이 되기 전에는 수필읽기를 권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이유가 수필이란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의 결과물인데 자라는 청소년의 경우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필의 내용에 감화되어 생각이 고정되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 그때는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았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다. 내 생각에는 수필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해답을 알려 주는 것 같다. 소설과 같은 다른 것들은 꾸며진 것이 많은데 수필은 오히려 일기와 비슷하다. 살아있는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엿봄으로써 내 지혜와 반성으로 삼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KBS <인간극장>을 즐겨보는 것도 같은 이유라 하겠다.
저자가 서문에 밝힌것이 있는데 각각의 수필이 날짜 순으로 나열되었다는 점이다. 날짜순으로 읽어나가는 것이 나에게는 조금 더 편안하게 느껴진다. 전에 읽었던 다른 수필은, 특히 주로 주제별로 묶어놓은 경우가 그런데 언제 쓰여졌는지 알 수가 없기에 미묘하게 사유의 연결이 끊어진 것 같았다. 아무튼 저자는 책을 사랑한다. 이것은 남녀가 사랑으로 서로를 애무하듯이 그런 의미로 책을 사랑한다는 뜻이다. 김제동이 지식인의 서재에서 "책은 펼치면 생물이고, 교감하면 친구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애무의 정도는 저자가 더 심한 것 같다.
너덜너덜한 겉모습 (63페이지): 나는 책을 비교적 험하게 다룬다. 지금은 연필이나 샤프펜슬도 가끔 쓸 만큼 그 정도는 조금 덜해졌지만, 볼펜, 빨강펜, 파랑펜, 각종 색깔의 형광펜으로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고, 네모치고, 화살표, 별표 그리기, 메모쓰기를 서슴치 않는다. 그것도 모자라 포스트잇을 붙이고 모서리도 여러겹으로 접고 책도장도 찍는다. 이렇게 하는데는 이유가 있다. 인간의 기억은 엄청난 속도로 망각하는데, 색깔이나 도형이 연상작용을 일으켜 그나마 그것을 조금이라도 오래 유지 시켜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중에 그 부분만 찾아 다시 읽는 것 만으로 짧은 시간에 책을 두 번 읽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내 책은 개인적인 책이 되는 것이다. 저자는 이런 책을 새 책과는 엄연히 다른 책이라고 했는데, 나도 공감한다. 문제는 그렇게된 책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기가 곤란하고, 그럴리는 없겠지만 중고로 내 놓는다고 해도 제 값 받기는 틀렸다는 점이다. 하지만 난 그런 책을 오히려 환영한다. 저자의 일방적인 말에 누군가의 대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특별함이 뭍어 있는 것이다.
특히 저자는 극지방 탐험의 실패담에 매료된 듯 하다. 탐험가 오츠는 동상에 괴저까지 걸린 두 발 때문에 다른 대원들마저 지체된다는 것을 깨닫고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씩씩한 말을 했다. "밖에 좀 나갔다 올 텐데,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소." 그는 비틀거리며 눈보라가 휘몰아 치는 텐트 밖으로 나가더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상당히 유명한 유언이었다.
가장 인상깊은 글은 "집없는 책"이다. 이 글을 읽고 중고 서점에서 책을 사기 시작했다. 책은 활자가 인쇄되어 눈으로 읽는데 문제가 없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무슨 글이 담겨있느냐가 중요하지 표지나 책의 재질같은 겉보기의 고급스러움은 중요하지 않다. 물에 젖었다 말린 책이든 상관이 없는데 왜 중고서점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20권의 책을 주문했는데 4만5천원 밖에 안하다니.. "집 없는 책"의 주제는 이제 부터다. 어떤 교수의 강의를 들었을 때는 그 사람을 알게 되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지만, 그가 죽고 그의 서가를 보았을 때야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는 느낌을 묘사한 부분이다. 그러다 그 책을 주제별로 분류하고 나눠 버리니 책에서 느껴졌던 그 사람의 모습이 사라졌다는 내용이었다. "장서를 흩어놓는 것이 꼭 시산을 하장해 바람에 뿌리는 것 같았다고나 할까. 무척 서글펐지. 그래서 나는 책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소유한 다른 책들과 공존할 때에만 가치를 얻게 된다는 것, 그 맥락을 잃어버리면 의미도 잃어버린다는 것을 깨달았지." 서점에 있는 모든 책은 "집없는 책"이었던 것이다. 누군가의 집, 말그대로 사는 집으로 이사를 갈 때야 비로소 의미를 가지는 것 같다.
나는 언제쯤 서재를 가지게 될까.